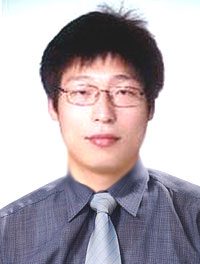 [투데이코리아=박대웅 기자]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는 시장경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시장경제가 부산저축은행발 금융비리로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투데이코리아=박대웅 기자]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는 시장경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시장경제가 부산저축은행발 금융비리로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시장경제 체제의 대부 애덤 스미스는 저서 '국부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기능을 강조했다.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자율통제 장치를 통해 시장경제는 통제경제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는 경제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정부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경제를 디자인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함께 감시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의 마술을 과신해 국가 경제를 완전히 방임상태에 두었던 20세기 초, 전세계는 대공황이라는 경제적 파국을 최초로 경험하게 된다.
대공황은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는 시장 경제의 갖가지 구조적 문제점들을 표면화시켰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수정자본주의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이때 시작된 논의는 결국 개별 주체들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은 물론 시장에대한 정부와 언론의 감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됐다.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촉발된 지금의 금융비리 사건들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직면했던 지난 세월의 경험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퇴보의 길을 걸었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할 정부의 감시기구들은 그들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물방울 다이아몬드와 돈다발 등에 눈이 뒤집혀 최소한의 기본윤리마저 져버렸다.
예금자와 투자자는 예금과 투자에 있어 안정성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는 형식논리에 불과하다.
국가가 '은행'이라고 인정하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자기네 자금을 믿고 맡겼다는데 누군들 이들의 선전, 선동에 넘어가지 않겠는가.
때문에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눈가림식 회계감사를 해온 회계법인 책임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며, 경영을 담당한 경영진과 대주주는 물론 비리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감독당국 역시 엄중히 대가를 치러야 마땅하다.
오는 8월 저축은행들의 2010년 회계년도(2010년 7월~2011년 6월) 결산 발표를 앞두고 '제2의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부는 최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당국 관계자는 "40조원 규모의 2000년 대우사태에 비해 저축은행 사태는 미미한 수준이며, 3조5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 기금을 활용해 부실 PF 대출을 매입할 방침이다"라며 우려 불식에 나섰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이 큰 현재의 상황에서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숨겨질 부실이 예상보다 클 경우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또 회계결산 발표후 저축은행들 중 추가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은행이 또 나온다면 예금자는 물론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신뢰는 바닥 끝까지 추락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어느 때보다 진솔한 마음으로 국민 앞에 솔직해야 한다.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손으로 땅을 치며 통곡을 하던 한 할머니의 넋두리가 기억난다.
"평생 모은 돈을 나라가 은행이라고 해 맡겼을 뿐인데 저금한 돈을 빼앗아 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는 국민의 불안한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공정한 감시자로 돌아와야 한다. 국민은 정부의 말을 신뢰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