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심해”…한 마디에 약해진 각오

이 장면을 옆에서 보던 한 남성에게 무슨 상황인지 물었다. 자신을 노숙인이라고 밝힌 그는 “매주 월요일에 한 번씩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천사’가 사비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것”이라며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한 분”이라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관계자에게 몇 인분 정도 되는 양인지 묻자 100인분 조금 넘는 양이라고 했다. 일손을 도왔다.
간단한 포장 작업을 마치고 간이 테이블을 철거하고 있더니 동료가 어느새 도착했다. 핫팩 4개와 우유 2개, 에너지바 4개가 든 봉지를 건네 왔다.
이제 하루 누울 자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 구역사 귀퉁이에 이어진 간이 텐트에 노숙인들도 하나 둘 잠을 청하러 들어갔다. 그런데 두려운 감정이 차츰 뒷덜미를 기어 올라왔다. 좀 전에 만난 이 아무개씨가 ‘어디서 자냐’ 묻길래 “지하통로 아무데서나 자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더니 이씨는 ‘조심해야한다. 여기 얼마 전에 문제 있었다’고 귀띔했다.
애초 노숙인 관련 ‘르포(현장체험)’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노숙도 불사해야한다고 생각해 침낭까지 가져오는 각오를 보였지만, 이씨의 ‘조심해’란 한 마디에 다리의 힘이 조금 풀린 게 사실이다. 동료에게 핑계를 댔다. “아까 만났던 그분들한테 침낭이랑 가져온 패딩 드릴까. 추워 보이던데.” 둘러대는 뉘앙스를 알아챈 듯 동료는 별 말이 없다.
◇ ‘타닥타닥’ 지하통로에서 울리는 타자 소리

저녁 9시40분. 침낭 위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오늘에 있었던 기억을 되살리며 취재수첩을 폈다. 얼마 안 돼 그런지 기억이 생생하다. 이곳에는 ‘노숙기자’를 포함해 모두 4명이 일렬로 눕거나 앉아있다. 잠시 일어나 발 방향으로 누워 계신 분께 우유, 초코바, 핫팩 각각 1개씩 드렸다. ‘오늘 잘 부탁드린다’고 하니 “허허” 너털웃음을 지으셨다. 조금 안심했다.
기사의 주제를 생각하고 어떤 방향, 형식으로 써내려 갈까 고민했다. 고민 끝에 기사 형식보다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써보자는 결론을 내렸다. 첫 도전이다. 모두가 잠든 조용한 지하통로에서 키보드 소리가 ‘타닥타닥’ 불규칙적인 소리를 낸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시계는 밤 11시40분을 가리키고 있다. 뒷목이 뻐근하고 하체와 손발이 차다. 글을 쓰는 사이 몇 명의 행인이 옆을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다. 25일 0시. 자정이 돼서야 노트북을 접고 자리에 누웠다.
◇ 좌불안석, 스스로를 취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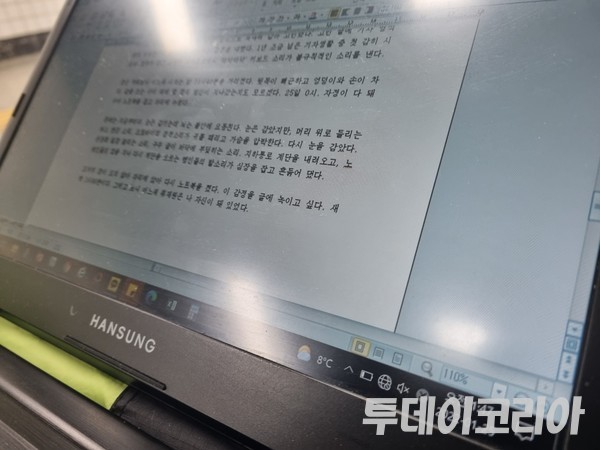
이 감정을 글에 녹이고 싶었다. 자리에 앉아 다시 노트북을 펼쳤다. 새벽 1시47분이다. 그러고 보니 어느새 ‘내가 나를’ 취재하고 있다. 또 사람 발소리가 들려온다. 이윽고 롱패딩을 입은 남성 노숙인이 다가와 담배 한 개를 부탁했고, 드렸다. 그는 목례를 하고 떠났다.
앉은 자리 왼쪽 벽면을 보니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 먼 길을 왔잖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런 글귀가 언제 그렸는지 모를 그림 속에서 지나간 시간을 품고 있었다. 노트북 배터리도 다 닳아 꺼졌다. 다시 자리에 누웠다.
새벽 2시다. 바깥 소리는 잠잠해졌고, 가끔 맞은편 너털웃음 아저씨의 기침소리만 들린다. 서울 아래 지하통로. 이곳에 있는 4명의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사정을 품은 채 같은 방향으로 누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생존 캠핑’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김찬주 기자
ckswn@todaykore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