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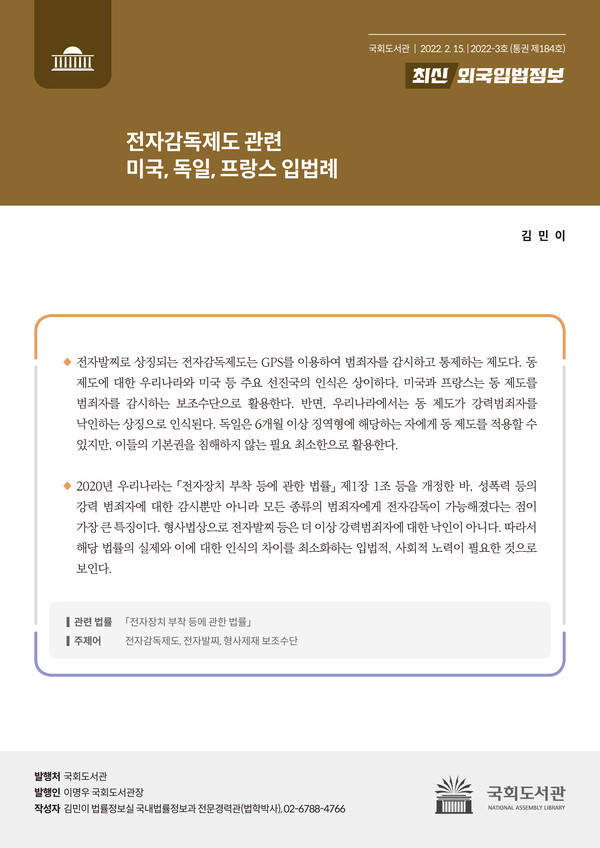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주로 범죄인에게 보호관찰, 재택구금 등의 사회 내 형사제재를 부과할 때 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전자감독을 활용하고, 독일은 6개월 이상의 구금을 선고받은 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소위 ‘행장감독’ 집행 시에 전자감독을 부가할 수 있다.
이어 프랑스의 경우 2019년 개정을 통해 경미한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형벌의 종류에 ‘전자감독 재택구금형’을 포함하기도 했다. 정리하면 미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에서의 전자감독제도는 사회 내 제재에 종속된 개념이다.
반면,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의 경우 2007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전자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 사회에 복귀한 범죄자를 감시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독립된 형사제재의 형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전자감독제도는 강력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인식된다.
아울러 2020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우리나라는 강력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 또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전자감독이 가능해지면서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인식과 법률의 간격이 생겼다.
주요 선진국들의 입법례처럼 ‘어떤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자감독이 가능하지만,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강력범죄자라는 인식이 여전히 만연하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이번 발간물에서 전자감독제도 관련 법률의 실제와 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입법적,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독일, 프랑스 입법례를 소개했다고 전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가 2020년 개정을 통해 수사·재판·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감독을 활용함으로써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등을 목적해왔다”며 “같은 법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의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입법적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찬주 기자
ckswn@todaykore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