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천여 공군 병력, 15번 걸쳐 한국戰 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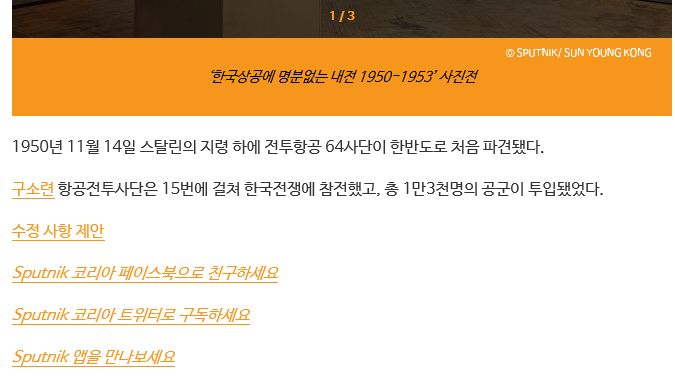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15일 광복절 당일 김정은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축전을 교환하고 "변함 없는 관계 발전"을 확인한 가운데 러시아 국영통신이 6.25전쟁의 소련 참전을 시인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12일 스푸트니크통신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국 상공에 명분 없는 내전 1950-1953' 사진전을 보도하면서 "1950년 11월 14일 스탈린 지령 하에 전투항공 64사단이 한반도로 처음 파견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구소련 항공전투사단은 15번에 걸쳐 한국전쟁(6.25)에 참전했고 총 1만3천 명의 병력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소련의 6.25 참전은 암묵적 사실로 여겨져왔다. 1990년 일본 지지(時事)통신은 러시아 개혁파 주간지 '모스크바 뉴스'를 인용해 소련 항공부대 1개 사단과 고사포 부대 등이 6.25에 참전했다고 보도했다.
소련 국방부 기관지 '크라스나야 즈베즈다(Krasnaya Zvezda)'도 같은 달 소련군 항공부대가 북한 영공에서 미 공군 격퇴 임무를 수행했다고 공개했다.
2010년 6월에는 우리 국방부 '6.25전쟁 제60주년 기념사업단'이 "한국전쟁 기간 중국 뤼순항이 소련군 전진기지로 활용됐다"고 밝혔다.
2013년 6월에는 소련 퇴역장성 출신의 세르게이 크라마렌코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1천여 명의 소련군 파일럿들이 중공군 복장을 한 채 참전해 125명이 전사하고 325대가 격추됐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대부분 제3자 또는 개인의 증언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졌다. 90년 러시아 국방부 기관지가 소련군의 6.25 참전을 밝히기는 했지만 친(親)서방 정책을 펼친 고르바초프 정권 하에서 나온 증언이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낮았다.
서방진영은 유엔이 침략전쟁으로 규정한 6.25를 소련이 군사지원했다고 주장하면서 소련을 비난해왔다.
매년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밀을 수입하는데다 개혁개방에 따른 후유증으로 외부 지원이 절실하던 고르바초프 정권은 서방 측 요구를 수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경제 침체에 의한 국력 약화, 그리고 대외 영향력 축소로 소련은 결국 붕괴되고 만다.

김일성(왼쪽)의 평양 입성 당시 고문 겸 감시역으로 동행한 소련군 장교들
하지만 이번 러시아 국영통신 보도는 소련군의 6.25 참전 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 어느 때보다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가 강화되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과 러시아 간 관계각 악화되는 와중에 나왔다는 점에서 신뢰도는 매우 높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은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대신 중국과 가스수출 계약을 맺는 등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서방 측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다. 작년 6월 김정은은 러시아와 북한이 "모든 분야에서 역동적 발전을 이뤘다"고 러시아에 감사를 표했다.
러시아 국영통신을 통한 이번 '시인'은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대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소련의 6.25 참전을 치부가 아닌 북러(北露)혈맹 역사의 '자랑'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으로 추측된다.
러시아는 북한이 자국 통제 하에 있음을 서방 측에 각인시킴으로써 경제제재 해제 카드로 쓸 수 있다.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핵무장 중인 미친개(북한)를 풀어놓겠다"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
6.25전쟁은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에게 '승인'을 받으면서 발발했다.
당초 스탈린은 미국과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했지만 한반도에서 미국과 대리전(戰)을 치른다는 방침으로 전환했다.
북한·중국과의 싸움에서 미국의 국력이 소모되는 사이 동유럽을 장악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유엔연합군 파병 투표에서 '기권'함으로써 북한을 '배신'했다. 21세기에도 유엔안보리에서 기권은 곧 찬성으로 간주된다.
스탈린은 그러나 북한이 한미(韓美) 주도의 유엔연합군에 점령될 경우 그대로 미국 지상군과 대치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 소규모 병력을 중공군으로 위장해 파병했다.
참전 미군 증언에 따르면 중공군 복장을 했지만 중국인과 확연히 차이 나는 슬라브족 특유의 거구로 인해 멀리에서도 소련군임이 단번에 식별됐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