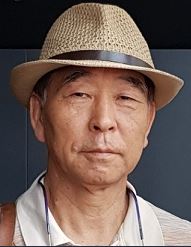
해방되고 무려 46년이 지난 1991년 8월, 최초로 일본군 성위안부 피해자 증언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219명의 피해자들과 여성운동가들이 모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를 발족했다. 이들은 28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를 열었다. 2016년에는 전쟁위안부 진상규명과 일본의 사과, 피해배상에 주력하던 활동범위를 넓혀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가 발족 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 ‘정의연’이 느닷없는 풍랑에 휩싸였다. 5월 7일 같이 활동하던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어 윤미향 대표(더불어 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의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일파만파로 번졌다. 기자회견 요점은 <수요 집회 방식의 문제, 할머니들 앞세워 모금한 돈의 행방, 윤미향 대표의 국회 진출,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 당시 윤미향 대표의 사전인지 의혹> 등이다.
회견 내용 중 일반인들의 가장 민감한 반응은 이용수 할머니가 섭섭하게 생각했을 법한 “재주는 곰이 넘고...”로 표현된 부분이다. ‘할머니들 앞세워 모금해 놓고 할머니들에게는 쥐꼬리만큼 쓰고 왜 엉뚱한데 썼느냐’ 쉽게 말해서 ‘대표가 착복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정의연’의 정관상 목적사업은 12항목이다. 할머니들의 생활비 지원 등 복지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하도록 입법이 되었다. 이렇게 된 것도 ‘정의연’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다. 물론 ‘정의연’ 정관에도 할머니들의 복지가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미치지 못한 섬세한 부분을 돕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연에 들어온 기부금은 목적사업이 지정된 모금이기 때문에 할머니들의 복지는 물론 대표가 임의지출 할 수 없는 돈이다.
문제는 이런 내용이라면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이용수 할머니는 왜 기자회견이라는 거창한 판을 벌였을까? 궁금증은 이날 기자회견을 주선한 '가자! 평화 인권당' 최용상 공동대표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의연’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는 점이다.
최 대표는 21대 총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에서 탈락했다. 탈락 후 그는 “정부와 민주당은 강제징용에서 손을 떼야 한다. 앞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중심으로 정권 퇴진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는 25일 2차 기자회견에서 뜬금없이 “왜 강제징용피해자(정신대)에 위안부를 얹느냐. 그러니까 일본이 인정 안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최용상 대표를 대변한 셈이다.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있자 기다렸다는 듯이 2015년 위안부 문제 한·일 협상 때 외교부 관료였던 인사들이 “당시 윤미향 대표에게 10억 엔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하면서 마치 윤 대표가 자신의 활동공간이 사라질까봐 합의 반대를 선동해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파기토록 했다는 암시를 풍긴다. 그러나 당시 수요집회 할머니들은 물론 국민정서도 일본의 사과 없는 보상금만의 합의에 반대였다. ‘정의연’의 활동목표도 이미 합의 이후 혹은 할머니들의 사망 이후를 산정한 것이어서 합의 반대이유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역시 검찰이 발 빠른 압수수색, 언론의 무차별 의혹 부풀리기 등 조국 사건의 판박이다. 사태를 키운 주역은 보수언론이다. 언론은 ‘맥주집 3000만 원’. ‘쉼터 운영비 1억 원 중 아버지에게 7000만 원’처럼 의혹만 제기할 게 아니라 당사자의 해명을 같이 실었어야 한다. 그랬으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다.
2차 기자회견 때 일본 기자 200여명이 몰려들었다. 이는 일본 우익이 쾌재를 부른다는 뜻이다. 기자회견에서 그들이 하나 건진 게 있다. ‘위안부’와 ‘정신대’ 혼용하지 말라는 할머니의 주장이다. 이는 근로 정신대는 인정하지만 성 위안부는 없었다는 일본의 주장에 틈을 열어주는 발언이다.
이 대목에서 수십 년 전부터 한국 사회에 깊이 파고 든 ‘일본재단’이 떠오른다. 이 재단의 설립자 1급 전범인 사사까와 요이치(笹川良一)는 1970년 통일교회 합동결혼식 777쌍 신랑 전원에게 손목시계를 선물해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그 후 이 재단은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10여개 대학에 학술연구를 지원했다. 1976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1등 수교훈장을 받기도 했다. 또 ‘예비역 장성모임(성우회) 안보협의 연구, 영화배우 이서진과는 환경기금을 창설하기도 했다.
해방 76년, 1급 전범이 설립한 재단은 이 땅에서 활개를 치고 ‘종군 위안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는 큰소리치는 데 위안부 문제 해결하자는 시민단체는 자국의 적으로부터 뭇매를 맞는다. 도대체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