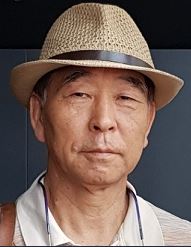
선입견은 때로 엉뚱한 오독(誤讀)을 낳는다. 한양대학교 정민 교수의 ‘한시미학의 산책’은 한 줄 오독으로 조선 유학의 종주를 외설작가로 만들어버린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한번 떠난 뒤로 여러 해 소식 없어/수자리의 삶과 죽음 그 누가 알리/오늘 처음 솜옷을 지어 보내니/울며 보내고 돌아올 때 뱃속에 아이 있었네.> 포은 정몽주의 ‘정부원’(征婦怨)이라는 제목의 이 시는 국경지방으로 수자리 떠나는 남편과 헤어질 때 뱃속에 있던 아이에게 얼굴 모르는 아버지의 솜옷 심부름을 보내는 민초의 애환을 담았다.
그런데 이 시를 가지고 어느 사학자가 자기 논문에 <고려 말 명유 정몽주의 ‘정부원’이라는 시에서 수년간 소식이 없던 남편에게 솜옷을 보내면서 뱃속에 아이를 가졌노라고 알리는 외설적인 문학작품이 근엄한 유학자의 문집에 실려 있다>고 썼다.
재일 국문학자 김달진(金達鎭) 씨가 번역한 이 시의 결구 <‘울며 이별하고 돌아올 때’ 뱃속에 있던 아이 편에 보낸다>(泣送歸時在腹兒)는 뜻을 ‘솜옷을 보내고 돌아올 때’로 오독함으로서 남편 떠난 후 딴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시의 격으로 봐도 천양지차가 나는 이 오독은 고려 말 포은 선생에 대한 무례로 끝나지만 만약 이런 유의 오독이 실제인물을 중심으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 5월 30일, 조선일보는 "윤미향, 자기 딸 학비 '김복동 장학금'으로 냈다" 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윤미향 의원이 2012년 3월 13일 페이스북에 “김복동 할머니 장학생으로 경희대 음대 피아노과에 입학한 김OO씨(윤 의원의 딸)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 68만 2785원을 나비기금 조성금으로 기탁··”이라고 쓴 것을 근거로 작성한 기사다.
이 기사가 나간 후 삽시간에 온라인상에 “위안부 할머니들 앞세워 조성한 장학금, 자기 딸이 수혜” “끼리끼리 나눠먹는 장학금” 등 윤미향과 정의연 매도로 도배를 했다.
윤미향 의원이 ‘김복동 할머니 장학생’이라고 쓴 페이스북 글이 일파만파 화근이 되었다. 윤 의원은 다음날 문제가 된 페이스북의 ‘김복동 장학생’에 대해 해명하면서 자신이 2012년 2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소개했다. “어느 날 할머니머니께서 당신 방으로 부르시더니 '저게(윤 의원 딸) 아빠 감옥에 간 뒤에 외롭게 자라서 늘 가슴이 아팠다. 우리 일 하다가 너희 부부가 만나 결혼하고 OO를 낳았는데 내 가슴이 우째 안 아프겠노?'라며 대학 입학금에 보태라며 격려금을 주셨다."는 내용이다.
김복동 장학금은 2015년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윤 의원이 페이스북에 장학금 운운한 글을 올린 것은 2012년이다. 윤 의원이 할머니로부터 받은 격려금을 무심코 장학금으로 표현했음을 이해하는 데는 대단한 문해력이 필요하지도 않다. 기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2012년에는 공식적인 ‘김복동 장학금’이 없던 때다. 윤 의원은 어떤 방법을 통해 자신의 딸에게 김 할머니의 장학금이 지급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썼을 것이다.
윤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는 ‘김복동 장학금’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혹시 오해의 소지를 염두에 둘 일도 없었다. 그런데 무슨 경위 설명을 한단 말인가? 따라서 이 기사는 당연히 윤 의원에게 직접 묻고 썼어야 한다. 물었는데 대답을 회피하거나 납득이 안갈 때 얘기가 달라진다.
폐일언하고 이 기사는 고의성이 짙은 오보이며 오보도 전략이라면 그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 딸 유학비, 집 5채, 회식비 3,300 만 원 등 1일 1건 시리즈로 쏟아져 나온 의혹들이 다 해명됐음에도 여전히 대중의 일반적인 인식은 ‘할머니들 앞세워 등 처먹는 사람들’로 고착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지난 해 조국 사태 때 이후 유난해졌다. 누군가 한 사람을 지목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 초토화 해버리고 해명이 돼도 만신창이가 되는 ‘홍위병 식 특정인 죽이기’가 다반사가 되었다. ‘당신은 돈 줬다고 말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허위증언 교사까지 하는 기자가 등장했으니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제도 발의가 나올 법도 하다. 어느 세상이나 음해성 오보, 악의적 허위보도도 가끔 있기 마련이어서 가능하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제도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람이 개를 무는 현상이 다반사가 되면 얘기는 달라질 것이다.

